이지누 지음/ 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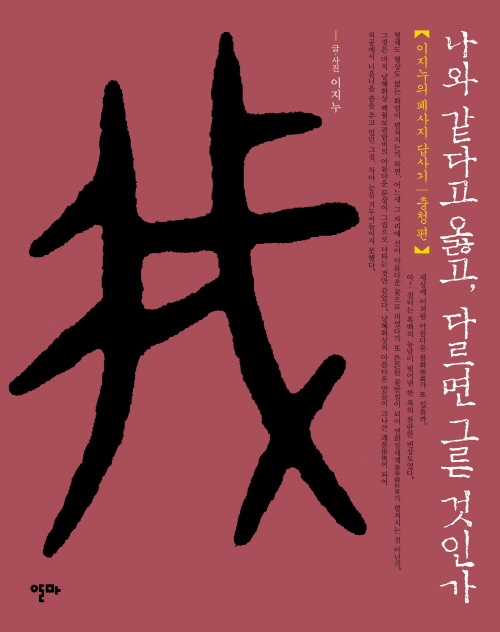
전국에는 5,400여 곳의 폐사지가 산재해 있다. 이미 오래전 법등이 꺼진 이들 폐사지에는 몇몇의 석조 유물들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남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저자 이지누는 80년대 후반 구산선문 답사를 시작으로, 오랜 세월 전국의 주요 절터를 수차례 답사해왔다. 여러 장소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특히 같은 장소라고 해도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반복해 답사함으로써 절터의 진면목을 그려내기 위해 애써왔다. 더구나 충청도 절터의 경우에는 저자의 공부방이 있는 수도권 지역과 그리 멀지 않아 훌쩍 오가기를 옆집 가듯 했다. 이는 얄팍한 감상과 흔한 자료가 뒤섞인 답사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이와 깊이를 이 책에서 기대하게 한다.
이 책의 주요 축인 사진은 절터 현장을 매우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멋이나 장식, 기교 등을 배제하고 담백하게 현장을 담았다. 이는 디지털 기술로 사진을 예쁘게 보정하는 경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실제 그대로를 찍어도 얼마든지 품격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한컷 한컷이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는 사진을 수십 번의 답사를 통해 얻어냈다. 그야말로 ‘발로 찍은’ 다큐멘터리 사진의 진수다. 자연의 햇빛을 통해 담아낸 절터 현장의 색감과 질감은 독자의 시각과 촉각을 즐겁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글에서는 청각과 후각이 특히 두드러진다. 이를테면 저자는 제천 월광사터에서 “마른 낙엽 위로 또다른 낙엽이 떨어져서 서로 부딪는 소리”(193쪽)에 주목하며, 그 “가을 햇살처럼 투명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탐미적인 청각의 향연 뒤에는 이를 관음觀音 또는 관청觀聽 사상과 연결시키며 감성의 깊이를 그윽하게 더한다. 또한 당진 안국사터에서는 “잎들 마르면서 나는 향기가 새벽의 눅진한 공기에 묻혀서 하늘로 떠오르지 못하고 절터에 가득 차 있었다”(107쪽)며 후각적 즐거움에 흠뻑 젖는다. 이곳에서 역시 안국사터의 매향 및 미륵사상을 고려해 “돌미륵이 하생한 것을 기뻐하며 온 산의 나무들이 자신의 몸을 흔들어 스스로가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향기를 내뿜는 것만 같았다”며 감성과 지성이 어우러진 표현을 일궈낸다.
이처럼 저자는 책 곳곳에서 화려한 감각의 향연을 펼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탐미적 경향은 타락이나 파괴로 흐르지 않고, 찬탄이나 경건함으로 이어진다. 그것이야말로 절터의 풍경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의 정체라고 저자는 말하는 듯하다.
정리 이주리 기자 juyu2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