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서울 그때를 아십니까?
세월에 따라 강산도 변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굳이 세월이라고 할 것도 없이 빨리 빨리 변하고 있는 게 서울의 모습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생겨나는 아파트, 그리고 새로운 빌딩들…. 아주 정신을 못차릴 정도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도 사방에선 고공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포크레인이 땅을 파내고 있는 모습들 뿐이에요. 이러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찾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속도가 빨라졌을까요? 그건 근대화 이후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에요. 조선 왕조 이후 한반도의 중심이었던 서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이 조선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시골사람들에게는 살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이에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고, 마소 새끼는 제주로 보내라’는 속담이 생겨났을 정도에요.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사진으로 보는 서울>을 중심으로 근대화 과정에서의 서울을 매주 소개해볼까 해요. 사진에서 느껴지는 서민들의 삶이 풍요로운 오늘의 기반이 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더욱이 강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충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셈이죠. 옛 서울의 모습도 감상하고 변화하는 생활상도 느껴보세요.
1. 여름서당

일제 시대 신식교육이 늘어나긴 했지만, 네댓 살만 되면 아이들은 집에서 천자문을 배웠다. 보통 하루에 네 글자를 외어 250일이 되면 책을 떼었다. 천자문 한 권을 떼면 떡을 만들어 잔치를 하기도 했는데, 이를 `책씻이` 또는 `책거리`라 했다.
2. 서당 모습(1930년대)
천자문을 떼면 서당에 가서 동몽선습과 명심보감을 배웠다. 부잣집에서는 독선생(가정교사)을 두기도 했다. 여전히 한자가 일상생활에 사용됐기 때문에 서당은 꽤 많이 남아 있었다. 이런 기초 한문과정을 거치고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보통학교(초등학교)에 입학했다.
3. 성균관 명륜동
4. 신식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
조선인 소학교는 보통학교, 중학교는 고등보통학교라 불러 일본인 학교와 차별을 했다. 보통학교와 소학교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다. 소학교·보통학교는 1941년에 국민학교로 이름이 바꿨다.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일제가 학교 이름을 바꾼 것이다. 국민학교는 일제 파시즘 교육의 산물로, 이 부끄러운 이름이 초등학교로 바뀐 것은 불과 몇 해 전의 일이다.
5. 공립소학교 운동장과 어린이들
6. 봉래동 길가에 늘어선 전선주들(1930)
1940년대 이르러서야 조선인 총 가구 420여 만호 가운데 겨우 10% 만이 전기 불빛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인 가구는 모두 전기생활을 했으니, 조선사람의 불편과 문화적 소외감, 그리고 차별에 대한 반발은 사라질 수 없었다.
7. 동대문발전소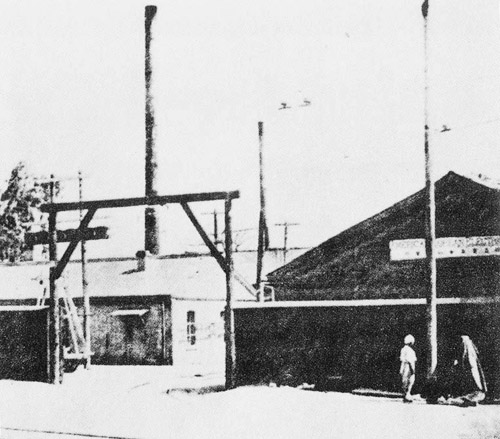
김승현 기자
juyu2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