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생각> 탄저균 사태 그리고 저신뢰 사회의 피로감
지난 6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메르스 쓰나미로 몸살을 겪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던가! 바레인 여행객 한 명에서 시작된 메르스는 결국 소비위축으로 자영업자 상당수가 줄폐업을 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겨 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등 더 이상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정부와 대통령은 매년 유행하는 감기일 뿐이라며 초기에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어나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정부를 국민 모두가 질타했다. 세월호 당시 뉴스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실종자와 사망자가 카운트 되는 살 떨리는 풍경은 어느새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 카운트로 뒤바뀌면서 묘한 기시감마저 불러일으켰다. ‘아니, 어쩜 이렇게 정부는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안일하고 무능력할 수 있는지’, 사고 자체의 충격만큼이나 정부의 일관된 무능이 놀라웠다.

그런데 그 당시 메르스 뉴스에 슬며시 묻힌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더 있었다. 미 국방부가 우리나라 오산 미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냈다는, 도무지 상식적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다. 미 국방부가 비활성 탄저균 샘플을 미국 내 9개 주 연구소와 우리나라 오산 미군기지에 보냈는데 우리나라에 배달된 샘플이 살아있는 탄저균일 수 있어,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폐기했다고 했다. 그리고 뒤이어 이어지는 말. 오산기지의 실험요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되었으나 즉시 의료조치를 해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단다. 결론적으로 미 국방부의 배달사고는 단순한 실수였고 아무 문제없이 조치를 끝냈으니 한국은 크게 걱정 하지 말란 소리다. 마치 한 택배회사가 배달을 엉뚱한 곳에 하는 실수를 해놓고 고객에게 택배물건을 잘 회수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투의 상당히 건조하고 사무적인 반응이다.
문제는 미 국방부의 어이없는 택배실책에 대한 사과를 역시나 사무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정치상황이다. 정부는 왜 탄저균을 배달했는지조차 당당하게 물어보지 못하고 어떻게 탄저균을 폐기했는지조차 모른다. 심지어 탄저균이 배달됐을 때 정확한 상황보고조차 받지 못했다. (미국은 5월 22일 주한미군에 탄저균이 배달됐다고 했으나 정작 우리 정부는 27일이 돼서야 반입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탄저균은 치사율이 무려 80%에 달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2001년 탄저균 포자가 우편으로 배달돼 5명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을 만큼 치명적인 생화학무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미국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한다. 물론 특정 언론사는 분개하고 각종 시민모임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소파개정을 촉구했고 시민단체는 생화학무기법 등의 위반혐의로 주한미군을 검찰에 고발했다. (온오프라인 국민고발단은 8703명이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러한 어이없는 상황에 대다수는 분노하지 않는다. 메르스와 달리 탄저균 사태에는 대중의 분노가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필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왜 나는 이렇게 가혹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침묵하게 되는가.’
다만 메르스가 무방비로 퍼져나간 것이 탄저균 배달사고를 덮으려는 정부의 음모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괴담을 우스갯소리마냥 내뱉을 뿐이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로저코언은 음모론이 무력한 자의 궁극적 도피처라고 말한 바 있다(Conspiracy theory is the ultimate refuge of the powerless. If you cannot change your own life, it must be that some greater force controls the world.) 대개 정보공개가 제한된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무기력에 빠진 국민들이 본인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로잡히기 쉬운 마음이 바로 음모론이란 거다. 어쩌면 필자를 포함한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로 이 무기력에 빠진 건 아닐까. 일종의 분노의 역치 상황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고 이젠 분노를 표현할 기운조차 없다.
사실 정말 그렇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세월호 대참사를 빚었다며 모두가 분노했지만 분노는 잠시뿐, 세월호 사태는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사그라들었다. 메르스 광풍으로 반쪽짜리 총리가 취임하고 세상을 뒤흔들 듯 떠들썩했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 역시 조용히 마무리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분노는 한낱 실망 정도로 이어질 뿐이다. 이에 정부에 대해서만큼은 분노를 촉발하는 역치가 점점 높아진다. 한 마디로 하도 열 받는 상황이 많아서 이젠 열 받는 것조차 피곤해진, 분노 피로도가 축적된 상황이다. 세월호에 메르스까지 그야말로 폭탄이 계속 터져서 탄저균 사태에까지 분노할 여력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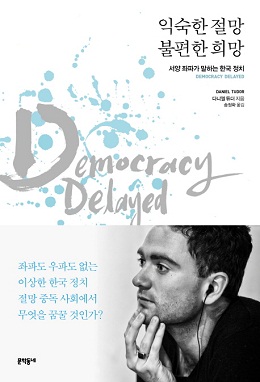
영국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으로 일한 전력이 있는 다니엘 튜더의 책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러한 피로감이 어디서 연유했는지 조금은 엿볼 수 있다. 부제가 ‘서양좌파가 말하는 한국정치’인 만큼 바깥에서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에서 의외의 진짜 한국 정치판의 모습이 보인다.
사실 정치 피로도가 축적된 이유는 정부의 무능력함 뿐만 아니라 좌파와 우파가 끊임없이 들이미는 분열의 프레임 때문이기도 하다. 포퓰리즘, 종북, 반미로 확대 재생산되는 비생산적인 정치 담론들이 결국 정치에 무관심한 대중을 만들어냈고 무관심한 대중 덕에 나쁜 정치인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 걸핏하면 반미편향적인 비판만 하거나 레드콤플렉스를 이용해 대중을 선동하기만 해서, 결국 좌파, 우파 모두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채 이념싸움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세월호도 결국 친북 좌파 논란으로 얼룩졌던 만큼 미국과 관련된 탄저균 사태도 반미 혹은 레드콤플렉스 논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테고 막판에는 이마저도 비슷한 이념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분열의 프레임 속에서 무한 반복되는 담론으로 국민들은 이미 피곤할 만큼 피곤해있다. 미국에게 끌려 다니며 제 목소리 못 내는 일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와도 결국 입도 뻥긋 못할 걸 이미 안다. 또한 걸핏하면 한 쪽은 북한의 위협을 거론할 테고 한쪽은 반미민족주의에 자주국방을 강조할거다. 황교안 총리가 야당의 소파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진상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실질적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 역시 그다지 새삼스러운 광경도 아니다. 정부나 정치 전반에 대한 저신뢰가 장기화되면서 생긴 국민의 무력감은 자연스런 결과인 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려되는 상황은 바로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회피적인 태도다. 결국 대의나 공공의 이익에는 무관심하고 개인의 소소한 이익에만 항변하는 다른 의미의 분노사회가 될 소지가 크다. 이미, 대중은 개인의 작은 손해에는 크게 분노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큰 손해에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치사율은 높지만 내 삶에 직적접인 영향을 주지 않을 듯한 탄저균보다 내 가족이 걸릴 확률이 큰 독감이 나에겐 더 위협적인 존재란 거다.
‘우리는 왜 분노하지 않는가.’
정작 분노해야 할 일에 침묵만 한다면 결국 남는 건 민주주의의 후퇴뿐이다. 나쁜 정치인은 아마도 계속 분노의 역치를 높여 대중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도록 계속 짜증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나름 이 방법을 쓰는 모양이다. 이제는 웬만하면 화조차도 나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이 태반이니. 하지만 정치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과 무기력이 계속된다면 세월호와 메르스 그 다음엔 또 어떤 사회적 재앙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