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강진수의 ‘서울, 김수영을 읽다'- 9회

(엽서 하나)
편지를 쓰다보면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듯이 써내려가는 때가 있다. 그동안 오래 묵혀두었던 말들을 겨우 끄집어내는 것만 같이. 그것이 활자의 매력이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고백할 시간을 가지게끔 한다.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자유로울 것을 말한다. 우리는 늘 말과 글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부자유하다. 하지만 내가 쓰는 글이, 반짝거리고 아름다운 활자들에 의해서, 말이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면죄부를 받아낼 수 있다면.
김수영은 자신 영의 죽음을 시에서 고백한다. 자신의 부끄러움,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고백하고 그 활자의 반짝거림으로 모든 만물을 들여다본다. 여기 그의 고백이 정점에 이르는 시 한 편이 있다. 온갖 어렵고 날카로운 표현들로 자신의 물렁물렁한 고백을 기어코 감춰보고자 해봤던 시 한 편이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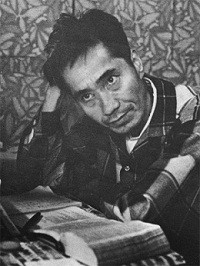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사령(死靈)’, 김수영.
이런 부끄러움에 영의 죽음을 고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김수영의 넋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날카로워져 부끄러움을 등에 업고 자신이 살아 있음을 드러낸다. 반짝이는 활자가 말하는 자유는 결국 황혼과 돌벽에 껴있는 잡초와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과 욕된 교외에서 다시 비롯되는 것이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자유와는 먼 것과 같이 보여도, 실은 그 뿌리란 것이 그렇게 다 욕된 것에서 시작된다.
(엽서 둘)
근성이란 이런 것이다. 풀이 바람에 나부끼는 계절에도, 비도 내리고 날도 흐린 시절에도, 사람 사는 것이란 이렇다. 근성 있게, 끈기 있게, 살아남아야 한다. 김수영이 그토록 바라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로운 사랑이란 결국 끈기 있게 살아남아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 ‘풀’, 김수영
사는 방식에 대해 시는 읊는다. 그렇게 김수영의 시는 가장 단조롭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관하여 기술한다. 풀이 늘 바람에 누웠다가 결국엔 다시 일어나듯이, 활자의 반짝거림이 말하는 자유는 고개를 숙여 쟁취하지 못하다가도, 돌벽 아래 남겨놓은 한 뿌리의 잡초 때문에라도 나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될 때, 우리는 굳건히 살아있는 풀을 보며 내 영 또한 살았음에 환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김수영의 영 또한 여태껏 살아 움직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