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 지음/ 글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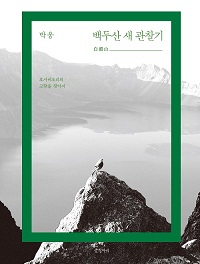
호사비오리라는 이름의 ‘호사豪奢’는 호사비오리의 화려한 생김새에서 비롯되었다. 머리의 긴 댕기와 선명한 붉은색의 부리, 옆구리의 용을 닮은 비늘 무늬는 호사비오리만의 특징이다. 제3기의 빙하 기후에서 살아남은 화석종인 호사비오리는 현재 지구상에 1000마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구상에서 천만 년 이상을 살아왔으나 지금은 인간에게 밀려 멸종위기종이 되어버린 호사비오리를 찾아 한 사진가가 백두산을 올랐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걸쳐 솟아 있는 백두산 영봉은 중국을 경유해서만 오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호사비오리는 봄이 되면 번식을 위해 백두산으로 돌아간다. 다큐멘터리 작가 박웅은 분단된 남북을 자유로이 넘나들고 백두산을 고향 삼는다는 점에 이끌려 호사비오리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연길공항으로, 연길에서 다시 백두산까지 수 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사람의 길과는 달리 호사비오리는 한반도를 가로질러 백두산을 자유롭게 오갔다. 이것은 호사비오리의 매력에 홀린 한 사진가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기 위해 6년간 백두산에 올랐던 기록이다.
저자는 호사비오리를 찾아 백두산을 찾을 때마다 틈나는 대로 호사비오리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의 생태 또한 관찰해왔다. 그중에는 물론 백두산에서 처음 보는 새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친숙한 새들이었다. 수리부엉이나 노랑때까치, 후투티와 파랑새, 새호리기 등은 모두 저자가 한국의 새를 관찰하며 만났던 새들이다.
야생의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새의 습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습성을 모르는 낯선 새를 관찰하려면 새를 뒤따라다니면서 관찰해야 하는데, 날개가 있는 데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새를 두 발로 쫓아가며 관찰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그토록 힘들게 야생의 새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생태와 야생 그대로의 모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려하고, 단 한순간의 사진을 찍기 위해 몇 시간이고 심지어는 몇 달 몇 년이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즐겁다고 말한다. 원하는 한순간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무한한 기다림 말고는 수가 없다. 저자는 새를 찾아 자연을 누비는 과정에서 인간 역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일 뿐이라는 겸손함을 배웠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소중한 깨달음을 나누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