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씨티알사운드 레이블’ 대표 황현우-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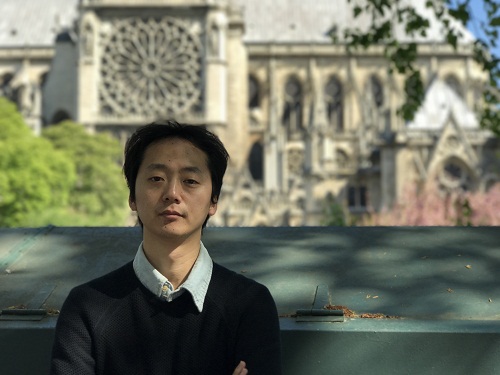
“가장 좋은 점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하는 일이나 결과가 다 내 것이라는 거야. 회사는 고용된 입장이라 잘돼도 내 것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서 좋아.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다. 그는 해야 하는 일이 다 정해져있으면 재미가 없는데, 자신은 자유로우면서 랜덤한 일을 하니 재미있다고 한다. 다만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정하지 않은 수입이 제일 문제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나한텐 더 마이너스야.”
그는 될 수만 있다면 건물주가 되고 싶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건물주가 되지 못할 거라면, 어차피 돈을 벌어야하는 삶이라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닐까.
문득 예술을 하는 이에게는 창작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법한데, 어떻게 일이 재밌고 좋다는 이야기만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필자는 학내언론과 이곳에 글을 쓰고 있는데, 오로지 나 혼자서 원고지를 채워야한다는 점이 부담과 스트레스로 느껴질 때가 꽤 많다. 쓰고 싶다고 글이 써지면 얼마나 좋을까. 나 홀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뿌듯하고 재밌지만, 분명 힘든 일이다.
“스트레스는 새로운 자극이라서 괜찮아. 내가 언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지 예측도 못하니까 재밌지. 다만, 창작의 고통을 느끼는 예술인들이 많아. 새로운 걸 창조해야한다는 압박? 근데 한국 시장은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 음악 시장을 나라가 망쳤지. 음악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쉽게 무언가를 만들 수도 없고, 실험정신을 발휘할 수도 없어. 음악인데 서비스처럼 되는 거야.”
음악 시장을 나라가 망쳤다는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음원 시장이 망가진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P2P(peer to peer)는 개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데, P2P 공유를 하면서 음원을 무료로 쓰는 문화가 생겨버렸다. 음원은 공공재가 아닌 음악인이 만든 생산품인데, 사람들이 공공재처럼 쓰는 것이다.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만, 실은 다른 사람의 음악을 갖다 공짜로 쓰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때 ‘소리바다’, ‘당나귀’ 등의 무료 음악 사이트가 등장했고, 당시에는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메일로 음원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일일이 잡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나라, 즉 정부가 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다 실패했다고 말했다.
“속된 말로 한국 사람은 공짜를 좋아한다고 하잖아. 진짜 계속 그렇게 된 거야. 어떤 기업들이 월정액제로 월에 얼마를 내면 음악을 무한제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잖아. 근데 내 것인데 왜 기업들이 공짜로 파느냐는 거야. 옛날에는 소비자들이 공짜로 들었는데, 이젠 기업이 공짜로 내 것을 풀고 있어. 물론 내 음원을 유통해도 된다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긴 하니까 불법은 아닌데, 그 조항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야.”
모든 음악이 600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냥 소음을 녹음해서 음원으로 내도 600원이고, 몇 달 동안 합숙해서 녹음을 해도 600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을 내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불공정 거래가 일어난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시장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정부가 관리를 실패했다고 말했다. 생산자가 자본을 들여서 생산품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는 그 값어치를 알 수가 없다. 앨범을 제작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 값어치를 알려면 꽤 오랜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다. 이제야 음원이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고는 있는데, 아직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도 나는 이제 이 일을 오래하다 보니까 나 하나는 건사할 수 있어. 근데 새롭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쟤네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먹고 사는 거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꿈과 목표를 물었다. 그는 오래 잘 사는 것, 부모님의 건강 등을 이야기하다가 문득 주변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제 아저씨가 돼서 자꾸 참견하게 돼. 옛날엔 ‘알아서 하겠지’했는데 이제는 측은지심도 들고, 누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 싫어. 주변 사람들이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더라(웃음). 목표는 마포구의원이 되는 거야. 초기 목표는 정치를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는 거지.”
그는 미국의 음악상인 그래미워어드 후보에 올라 보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우드스탁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페스티벌이 없어져버렸고, 영국의 ‘글래스톤베리’는 두 번의 공연을 하면서 꿈을 이뤘다고 한다. 평생 개근상도 못타본 상복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을 받고 싶단다.
그는 그렇게 화려한 해외 공연 외에도,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공연에 참여한 적도 있다. 그는 항상 세월호를 이야기할 때, 국가가 당연한 것을 안 한 일이기 때문에 같이 요구하고 따지는 것이라고 했다.
“늙으니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지더라.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들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해. 우리나라는 유독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게 심하잖아. 근데 삼겹살집만 가도 정치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해.”

그는 지난 9월에는 ‘내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원하는 이유’라는 이름의 탈핵 콘서트도 참여했다. 앞으로도 관심이 있는 사회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한다.
“정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거야. 나는 음악을 하니까 음악으로 주장하는 거지. 원래 스피커와 마이크가 히틀러가 연설하려고 만든 거잖아. 마이크는 다수에게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마지막으로 그는 이타심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했다.
필자에게 사촌은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 신념이 뚜렷한 사람, 그 정도의 이미지였다.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늘 분명한 노선을 주장했고, 오랜 시간 음악을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 같았다. 이번 인터뷰는 그렇게 시작했다. 꾸준히 오랫동안 음악을 하면서 생긴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는데, 자신 혼자만의 이야기보다는 동료, 음악 시장, 정부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사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 지난번에 방문한 공연의 따뜻한 분위기와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 따뜻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음악과 공연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나 또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내 글이 따뜻할지에 관한 고민이 드는 밤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