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강진수의 '요즘 시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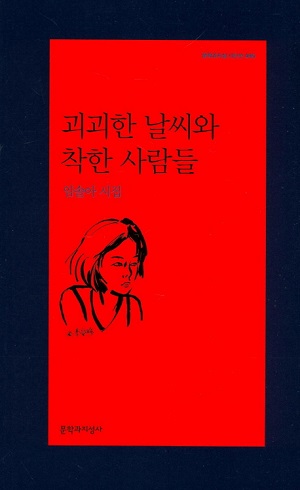
이 벤치에서 두 사람과 헤어졌다.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여기에 앉아 나를 기다렸다.
이 벤치를 지날 때마다 둘 중 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다.
오늘은 햇빛이 한 사람의 정수리를 통과하고 있다. 그에게는 그늘도 없다.
오늘은 빗방울이 한 사람의 무릎을 통과하고 있다. 그래 우리 그만하자.
사람을 통과한 비를 나는 만질 수 있다.
오늘은 여기 없는 다른 한 사람의 손끝에 있다.
한 나뭇잎은 허옇게 마른 그대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
다른 한 나뭇잎은 허옇게 그대로
멀리 사라져버린다. 죽은 채로 떨어져 내린 나뭇잎을 일일이 셀 수는 없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일 덧칠을 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일 사라짐을 경험한다.
그래 우리 그만하자는 말 좀 그만하자.
우리는 앉을 곳을 빼앗긴다.
너무 오래 비어 있는 의자는 누군가 맡아놓은 자리 같고
미안하지도 않아서 미안함은 너무 오래간다.
임솔아, <벤치>,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
이른 시각과 늦은 시각, 공원에 가본 적 있는가. 분명 둘 다 아직 캄캄한 시간대에 아무도 없는 것은 같지만, 두 시각은 누가 뭐라 해도 다르다. 일단 공기가 다르다. 공기가 다르니 시간이 다른 것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그곳에 가만히 있는 모든 것의 역사가 다름 역시 알게 된다. 이를테면, 어제 늦은 시각 벤치의 나이는 육백이십칠일이었고. 오늘 이른 시각 그것은 육백이십팔 번째 새벽을 맞이했다. 단 하루의 폭이, 실제로는 몇 시간 혹은 몇 분의 폭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든 간에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느낀다. 그 길고 짧은 시간 사이에 벤치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한다. ‘덧칠을 하고’, ‘사라짐을 경험한다.’

이 시에서 벤치는 관찰자의 위치에 있다. 벤치는 공원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구경하는 존재다. 공원에 들른 사람들에게 그곳의 나무와 풀을 만지고 경험하는 일은 드물지만, 벤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고 익숙한, 어떻게 말하면 공원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벤치의 시선이 공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닿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시선 속에 두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의 이별이 있다.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벤치인가, 다른 사람인가. ‘사람을 통과한 비’는 벤치에 내려앉았는가, 다른 사람의 손끝에 닿았는가. 이런 경계의 흐트러짐 속에서 공원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행위 하는 공간에서 벤치가 관찰하는 공간으로 변화한다. 사람은 장소와 그 장소의 물건들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런 매개로서의 벤치와 공원이 어느 순간 매개의 위치를 벗어나 사람 그 자체가 된다. 사람은 벤치가 되고 텅 빈 공원이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코 함께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없다. 한 사람이 벤치에 앉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벤치는 그 다른 누군가가 와서 앉을 때를 미리 기다린다. ‘우리’라는 울타리는 두 사람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 속에는 벤치가 있고 그 바깥에는 공원이 있다. 벤치와 공원은 같은 영역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둘은 별개다. 그 둘은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은 같은 영역을 거닐면서도 결코 같아질 수 없다.
관찰자가 관찰의 대상과 같아질 때, 그 순간은 공감의 과정을 거친다. 오랜 공감의 시간을 통해 관찰자는 관찰하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와 같아지는 때를 경험한다. 하지만 공감은 모방에 불과하고 같아진다는 것은 일종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벤치는 안다. 그래서 비는 사람을 통과하지만 여전히 벤치를 통과하지는 못한다. 그에게는 그늘도 없지만 벤치에게는 그늘이 드리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치는 여전히 사람이 되고 싶다. 벤치가 된 사람은 공원이 된 사람을 그리워한다. ‘우리 그만하자’라는 차가운 제안은 벤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져 온다. 그러나 벤치는 말한다. ‘우리 그만하자는 말 좀 그만하자’, 사람들의 이별을 벤치는 부정하고 거절한다. 이별은 평생 누군가를 기다려온 벤치의 삶에 부합하지 않는 단어다. 이별은 공원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사람들만의 언어다. 행위다. 습관이다. 섭리다. 사람이 아닌 벤치에게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쯤 되면 누가 사람인지, 누가 벤치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젠 벤치 같은 사람만이 있고, 벤치에 앉는 사람 혹은 벤치에 앉지 않는 사람만이 있다. 모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원을 상상해보자. 그곳의 나무와 풀도 사람이고, 가로등도 사람이고, 심지어 쓰레기통과 길바닥의 먼지도 사람이다. 공원은 그런 사람들의 무리이자 배경이다. 그 한가운데에 벤치가 있다. 벤치는 그 무리에 끼지도 빠지지도 못한다. 늘 그 무리를 향유하고 거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언가에 붙들려 평생을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을 이제부터 벤치라고 부르자.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공원이라고 부르자. 장소와 사물만으로도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임솔아 시인의 사유는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광활하지 않은 곳에서도 시인은 장소와 사물을 인지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사유할 수 있다. 벤치가 되어 지나다니는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공감을 넘어서 그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엔 이별할 수 있고, 이별을 부정할 수도 있다. 사람이 사물이 되는 것만큼 서글픈 일이 없다. 그럼에도 시인은 그 서글픈 생을 감당하려 한다. ‘매일 덧칠을 하고’, ‘매일 사라짐을 경험한다.’ 벤치가 된 시인은 머물러 있는 나뭇잎과 사라져버리는 나뭇잎의 ‘허연’ 색을 떠올린다. 그에게 공원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고,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가 앉을 곳은 없다. ‘우리는 앉을 곳을 빼앗긴다.’
왜 시인은 ‘너무 오래 비어 있는 의자’가 ‘누군가 맡아놓은 자리’ 같다고 말했을까. 실은 누군가 맡아놓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맡아놓아 주기를 바라는 것일 테다.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는 지난 번 와서 앉은 누군가를 항상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맡아놓은 것이라고 착각할 것이다. 이별을 하지 못하는 사물의 한계가 그것이다. 사람이 벤치가 되면 걷는 법을 잊고 만다. 지나가던 사람은 그 벤치를 보고 미안해하지만 ‘미안하지도 않다.’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사물은 사물의 방식대로 기다림을 자처한다. 텅 빈 벤치를 공원에서 마주치는 시각, 어쩌면 벤치의 역사가 다음 하루로 흘러가는 아주 늦거나 이른 시각, 사람이 사람을 위한다는 일에 우리는 사랑의 씁쓸함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그 상처 위로 겨우 덧칠을 해가면서 우리는 애써 그 벤치를 외면할 수도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