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지음/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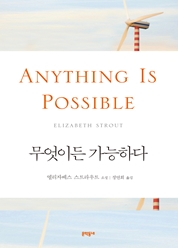
삶의 깊고 어두운 우물에서 아름답고 정결한 문장으로 희망을 길어내는 작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여섯번째 소설이 나왔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가상의 작은 마을 앰개시를 주요 무대로 하여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인물들의 삶을 아홉 편의 단편에 담아 엮었다. 제각기 자기 몫의 비밀과 고통과 수치심을 품고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욕망과 양심의 충돌, 타자를 향해 느끼는 우월감과 연민, 늘 타인에 의해 상처를 입으면서도 타인의 관심을 끝없이 갈구하는 인간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예리하게 포착해낸 작품이다.
각 단편은 모두 고유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 작품을 단편집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묵직한 깨달음과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세월이 지난 후에 삶을 되돌아보면, 당시에는 서로 큰 관련이 없는 것 같던 사건들이 느슨하면서도 필연적인 연결성을 지니게 되는 것처럼, 이 작품에 담긴 일련의 이야기들 사이에는 그런 성글지만 단단한 결합성이 있다. 이러한 구성이 주는 효과는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더욱 극대화되는데, 한 단편에서 이야기의 중심이었던, 즉 주체였던 인물이 다른 단편에서는 타인의 삶에 대상화된 조연으로 등장한다. 작품 속 인물들은 이렇듯 주체, 객체, 또 주체로의 전환을 반복하며, ‘나’라는 단일한 시선 안에 갇혀 타인을 대상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삶을 이해하는 더 넓은 시야와 깊이를 제공한다.
더불어 이 소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작품이지만, 스트라우트의 전작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을 사랑했던 독자라면, 같은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이 책에서 익숙한 공간과 반가운 인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의 주요 배경이 되는 일리노이주 앰개시는 전작의 주인공인 ‘루시 바턴’의 고향이며, 루시의 오빠와 언니를 포함해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다수가 전작에서 루시와 어머니의 대화 속에 언급되었던 사람들이다. 고향을 떠나 뉴욕에 정착한 루시가 쓴 회고록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이 극중에 등장하고, 누군가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기도 한다. 단편 「동생」에서는 루시가 십칠 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오빠 피트가 홀로 살고 있는 옛집을 방문한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살았기에 서로의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서로에 대해 ‘정말로’ 알지는 못하는 이들의 진실이 차례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소문 뒤에 숨겨져 있던 익숙한 인물들의 진짜 얼굴을 만나게 된다.
소설의 제목인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끔찍한 절망,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건네받는 이해와 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로 읽힌다. 가능성은 양쪽을 향해 열려 있지만, 타인의 육체도 정신도 공유할 수 없는 우리가 서로를,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예측도 통제도 불가능한 세상은 어느새 은근한 온기를 띤 모습으로 마음속에 자리잡는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에 서로를 구원하는 기적의 순간들이 어둠 속에서 깜박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빛이 오랜 시간을 날아와 언젠가는 우리 앞에 기어이 도착할 것임을 믿는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이 짧지만 강렬한 선언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읽는 것은 오독이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