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 문학주간에 가다-2회] ‘독자와 만나는 새로운 방식’ 편
[위클리서울=김혜영 기자]
다양한 문학인들이 운영하고 참여하는 축제, 문학주간이 열렸다.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예술이 꽃피는 마로니에공원 일대였다. 운 좋게도 모니터링 요원을 맡아 문학주간의 행사와 프로그램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무엇을 얻고 배울 수 있었는지 그 후기를 1편에 이어 나눠보려 한다.



두 번째로 맡은 프로그램은 ‘독자와 만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꼭 듣고 싶은 강연이었는데 운이 좋았다. 사전 예약도 순식간에 마감되었지만 시작 시간이 다가올수록 빗물이 내리다 못해 흐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갑작스런 폭우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시작을 10분 남겨두고 프로그램이 열린 예술가의 집이 가득 찼다. 스타 작가 이랑과 문보영, 사회를 맡은 오은 시인 덕분이었다. 작가들이 무대에 오르자마자 자리를 가득 채운 젊은 관객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댔다. 그러한 성원에 익숙한 작가들은 여유롭게 자기소개를 마치고 어떻게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학주간의 주제에 가장 적합한 이슈의 프로그램과 출연진이었다.
영화감독이자 음악인인 이랑 작가는 매일 글 한 편을 발송하는 ‘앨리바바와 30인의 친구 친구’라는 메일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암 투병 중인 친구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30인의 작가를 모아 시작했다. 문보영 시인 역시 시집을 출간하는 것 외에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다양한 글의 원고를 우편과 메일로 발송하는 ‘일기 딜리버리’도 진행한다. 예전에는 권위 있는 상을 통해 등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독립출판을 통해 ‘셀프등단’을 하거나 SNS나 메일 등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작가들이 많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매일 글 한 편을 쓰겠다며 등장한 ‘일간 이슬아’가 대표적이다.



사회를 맡은 오은 시인은 이랑과 문보영은 물론 다른 작가들의 메일링 서비스도 구독 중이었다. 덕분에 두 작가의 작품 활동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깊고 넓은 질문을 이어갔다. 두 작가의 플랫폼과 글을 간단하게 비교하고 분석하며 자신만의 견해가 담긴 궁금증을 풀어내기도 했다. 관객의 질문을 받는 30분을 제외하고는 사회자가 질문하고 출연자가 답변하는 형식이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다소 평이한 구조지만 질문과 답변에 유쾌하고 진중한 분위기가 고루 담겨 지루하지 않고 유익했다.
무엇보다 이랑 작가와 문보영 시인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내 서로의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보영 시인이 주제를 선정하고 일기를 작성한 덕분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 뒤, 이랑 작가가 다음부터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해보아야겠다는 고민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식이었다. 단순히 칭찬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플랫폼이 가진 한계와 구독자의 비평을 함께 분석하며 더 나은 방향을 모색했다. 보통 작가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은 신작을 홍보하거나 작가를 향한 찬양이 한 시간 동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의 틀과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인 만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답변과 형식으로 진행되어 지루할 틈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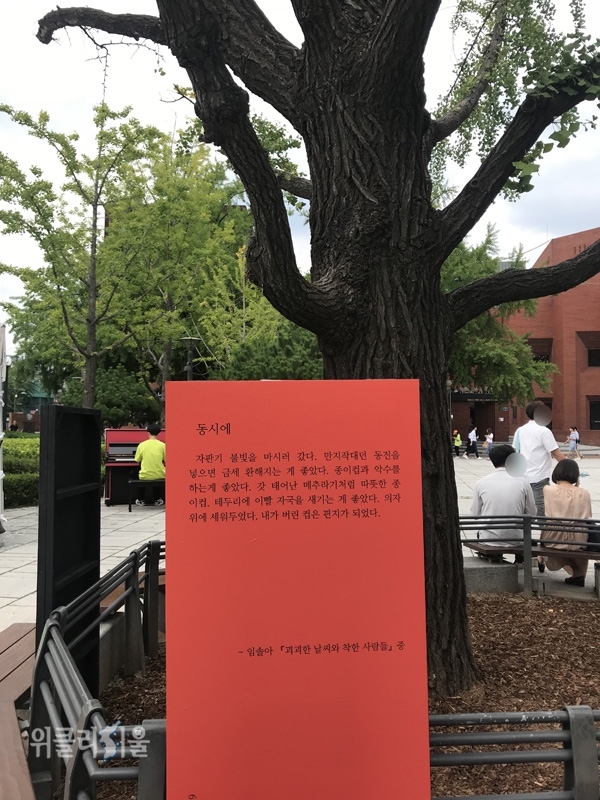
이랑 작가는 평소 독자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앨리바바와 30인의 친구 친구’의 큰 주제는 결국 아픔이다. 너무 무거워서 한 달 이상 보기 어렵다는 피드백도 받았지만, 어렵다고 느껴지는 아프고 어두운 이야기를 근육을 기르듯 단련하면 좋겠다는 신념을 보였다.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주제를 긍정성과 부정성으로 단순하게 나누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만화 등의 다양한 형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관객 중에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수록 소외될 수밖에 없는 노년 계층에 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랑 작가는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짚어준 관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문제의식을 통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고민할 것을 약속했다.
문보영 시인 역시 자신을 포장하거나 숨기려하지 않고 모든 담론에 솔직하게 임했다. 글을 쓰는 방식을 질문하는 관객에게는 자신이 쓰고 있는 다양한 글 전부를 종류별로 나눠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우여곡절 끝에 얻은 노하우도 가감 없이 전했는데,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각각의 파이도 성장한다는 최근의 담론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젊은 작가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 그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성취해낼수록 모두에게 작가로의 데뷔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 같은 N포 세대로서 더 많은 직업, 노동 환경, 취업 방식을 꿈꾼다는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해나가는 젊은 작가들이 자신의 영역만을 지키려들거나 으스대지 않고 모두의 발전을 꾀한다는 것을 느끼며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다. 문학은 파편화되거나 훼손되면 안 된다는 고루한 관념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물결에 적응하되, 뒤쳐질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방식 또한 고민해보겠다는 두 작가의 의지가 빛나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 문학주간의 주최단과 모니터링 요원들이 모두 모여 회의 시간을 가졌다. 각자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칭찬할 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었다. 덕분에 내가 참여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주최 측은 개선해야 할 점을 꼼꼼하게 챙겨갈 수 있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꼽은 가장 큰 문제점은 문학주간 자체의 홍보였다.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축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어쩌다 알게 되어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것.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문학계의 축제인데다 인력 문제 등까지 겹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듯 했다. 그럼에도 문학주간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아름다운 축제의 현장이었다. 내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담겨있었고, 우리가 사랑해온 문학과 작가들을 향한 응원과 애정이 흘러넘쳤다.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문학을 즐기기 어려운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쩌면 내년에도 모니터링 요원을 맡아 마로니에 공원을 유유자적 떠돌아다닐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