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강진수의 ‘요즘 시 읽기’
[위클리서울=강진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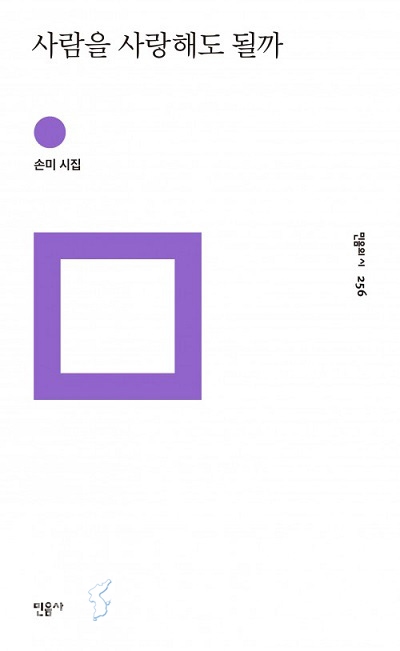
오늘은 달 대신 바위가 떴다
애인은 급히 방을 찾고 있다 바위에서 돌멩이들이 떨어진다 점을 치는 것이다
애인과 여자는 욕조 하나를 얻었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셋의 차가운 무릎이 닿는다
알죠? 나 언니 돌로 찍고 싶은 거? 언니만 생각하면 가슴 터질 것 같애 매일 언니 인스타 뒤져요 둘이 있을까 봐
욕조 위에 바위가 떠 있다 바위엔 얼어 버린 동물과 참고 참아서 쌓인 사람들
식어 가는 물속에서 누가 누굴 사랑하는지 모른 채, 우리의 무릎이 닿는다
어두운 데 웅크리고 있으면 팔과 다리가 붙고, 무거워지고, 그건 바위 같고, 빠지면 절제가 안 되고, 멈춰지지 않고,
알죠? 언니? 그림 그린다면서요? 나보다 돈 많으니까
언니 외로워서 그런 거잖아? 나 언니가 쓴 글 다 뒤져서 읽어요
나는 애인을 만지는 언니를 만진다
돌멩이가 떨어진다
서로에게
저를 던지면서
충돌한다
우리는 다 저기서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하나였으니까
오늘은 가지 마요 언니
살점이 떨어져도
사랑은 해야 하니까
가까이,
제일 가까이 있어요
손미, <돌 저글링>,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사랑은 질투가 아니다. 사랑은 다툼이 아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들 간의 밀접한 관련을 모른 체 할 수는 없다. ‘달’ 대신 ‘바위’가 뜨듯, 밝고 부드러운 것의 뒤편에는 어둡고 단단한 것이 자리한다. 그리고 그 뒤편은 언제든 앞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울 것이라고만 여겼던 사랑이 질투가 되고 다툼이 되는 과정은 특수하지 않다. 그 이유가 ‘달’과 ‘바위’의 동질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 둘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바위’가 ‘달’을 대신하는 과정은 시간에 의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다른 것이라고 여겼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다보면 다른 것도 같아질 수 있는 신비로움. 애초에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결과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당장 놓인 사랑은 느낄 수 있지만 먼 미래 속 그것의 변화는 느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제 뜬 ‘달’이 ‘오늘’ 뜨지 않고 ‘바위’가 되었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난센스 속에서 피어난 ‘돌멩이’들은 ‘점을 친다.’ ‘달’이 되지 못해서 뜰 수 없고 자꾸 ‘떨어지는’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미래를 보는 것이다. 질투가 된 사랑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 다툼이 된 사랑이 다시 누군가를 품에 안을 수 있을지. 단단해진 ‘나’와 ‘애인’, 그리고 ‘언니’ 이 셋은 단단한 대화와 만남을 나눈다. ‘차가운 무릎’만이 맞닿는 좁은 욕조 속에서 그들은 몸의 대화를 이어 나간다. 가장 관능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기류를 가만히 들여다보자. 냉담하다 못해 잔인스럽다. ‘돌멩이’는 마음에서 떨어져 나와 상대를 찍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흉기가 되고, 복수와 질투 그리고 상상 속에서 낭자한 핏자국들이 세 사람이 깊게 빠진 사랑의 현 주소를 말해준다. 5연에서 ‘얼어 버린 동물과 참고 참아서 쌓인 사람들’은 그 셋의 자화상이다. 쌓이고 얼어서 ‘바위’에 딱 붙어버렸다.
나아지지 않고 자꾸 깊어지는 세 명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갑자기 일으키는 또 다른 아이러니를 일으킨다. 폭력성과 복수심이 또 다른 종류의 사랑으로 변하는 국면이다. ‘언니’의 ‘인스타’를 매일 뒤지고 ‘언니’가 ‘쓴 글’을 다 뒤져서 읽는 행위들은 애인에게 향해야 할 화살의 방향이 엉뚱하게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불안함과 초조함은 질투를 집착으로 바꾸고 그 집착이 엉뚱한 대상에게 가닿도록 만든다. 7연에서 시인이 보여주듯 어둠은 짙어질수록 무게를 가지며 완전히 통제에서 벗어나버리는 것이다. ‘나’는 이제 사랑 그 자체를 증오하며 두려워한다. ‘애인’과 ‘언니’는 더 이상 가해자의 위치에 있지 않고, 그 감정들을 함께 나누는 동료가 된다. 일종의 동료애를 느끼며 ‘언니’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나’는 그녀를 ‘만진다.’ 다시 관능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몸을 느낀다. 사랑이 어디서 튀어나오는 것인지를 깨닫는다. 그 모든 ‘돌멩이’들은 ‘어차피 하나’였던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임을.
손미 시인의 사랑은 이처럼 마음의 병이다. 멀쩡했던 세포가 갑자기 암으로 변하듯, 사랑은 똑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누군가에게 아이러니를 선사한다. 도저히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왜 헤어졌는지 왜 만났는지 왜 다투고 질투하는지 왜 나를 떠났는지 암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려 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섬뜩할 때가 많지만 시인은 말한다. ‘사랑은 해야’ 한다고. 다른 누가 정한 규칙 같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다짐과 같다. 외롭고 혼자 있지 않기 위해 이기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가지 말라’고 붙들고 ‘가까이 있으라’고 요구한다. 꼭 질투의 대상, 분노의 대상에게 이 시의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정 반대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휘둘리며 내뿜는 자신의 이기심에 대한 노래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모순되면서도 자연스러운 일인지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돌아보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의 사랑을 앓아왔는지를. 또한 손미 시인의 직관적이며 본능적인 사랑을 부정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구만을 죽도록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끔 드는 생각은, 나는 나 자신 하나도 설득해내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오늘은 바위 대신 잊지 못할 얼굴이 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