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및 영화 속 전염병과 코로나19] 소설 '네메시스'
[위클리서울=김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의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에서 전염병을 어떻게 다루었고, 지금의 코로나19를 살아가는 현재에 돌아볼 것은 무엇인지 시리즈로 연재해볼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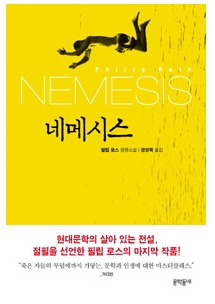
‘폴리오(Polio)’가 사라졌다. 지난해 8월 WHO는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에서 폴리오 바이러스가 종식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폴리오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해방된 것은 1955년 조너스 소크(Jonas Salk) 박사가 백신을 개발한 지 60여 년 만이다.
소설 <네메시스>는 폴리오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폴리오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한 미국 뉴어크를 배경으로 폴리오 바이러스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소년들과 이들을 감염시킨 한 청년의 일대기가 주요 내용이다.
이야기는 폴리오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1916년에서 28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된다. 작가는 한창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시점에서 훌쩍 뛰어넘어 다시 유행하던 수십 년 후인 1944년을 소설의 시대적 배경으로 잡았다. 사람들은 오래전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한다는 사실에서 무지했고 아무런 대비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작가 필립 로스는 폴리오 바이러스를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온 불행’으로 치환해 이야기를 끌고 나간다. 전염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아이도 어른도 부자도 빈자도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바이러스 앞에서는 제대로 된 감염 수칙만이 전염병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폴리오’라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아니다.
작가가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인생에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각자의 ‘삶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인간은 예기치 못했던 불행을 만났을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불행을 받아들일 것인가. 작가의 물음은 그렇게 시작한다.
천벌의 신인가 복수의 신인가, 네메시스에 담긴 뜻
폴리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소아마비’로 더 익숙한 감염병이다. 주로 5세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많이 전염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전염되어 걷지 못하게 되는 병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다. 폴리오는 무자비한 전염병이다. 바이러스는 사람의 뇌신경조직을 손상시키고 하지마비를 일으킨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몇 시간 혹은 며칠 사이에 하지마비가 급속히 진행되고 일부는 사망에 이른다. 생존해도 평생 하지마비 형태로 살아가야 한다.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장 바이러스가 감염병의 주된 원인이다.
소아들이 주로 감염되지만 성인이라고 예외는 없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도 39세에 폴리오에 걸려 하지마비가 왔다. 그는 그 후 일생을 쇠와 가죽으로 만든 보조기를 차고 다녀야 했다. 이처럼 폴리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지만 오랫동안 뚜렷한 원인도, 치료제나 예방책도 알지 못했다.
지금은 예방접종으로 인해 거의 사라진 병이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폴리오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갔다. 1916년 미국에서는 폴리오로 인해 2만700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6000명이 사망했다. 더 끔찍한 것은 살아남은 이들 또한 온전한 몸으로 살아가기 힘든 장애를 가진다는 점이었다.
소설의 주인공 버키 캔터도 그런 장애를 입게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폴리오에 걸리기 전 캔터는 누구보다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고 전쟁에 나가고자 자원할 만큼 애국심과 든든한 체력을 가진 젊은이였다. 불행히도 시력 때문에 전쟁에 참전하지 못했지만 이후 아이들의 체력단련을 시켜주는 놀이터 감독관 일을 택해 성실하게 근무하게 된다. 근무지는 미국 뉴어크의 작은 마을이었다. 아이들은 사랑스러웠고 모두 그의 말을 잘 따라줬다.
이곳에는 폴리오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었다. 그 해 여름 첫 폴리오 확진자는 가난한 이탈리아인 동네에서 발생했다. 석간신문 1면에는 ‘폴리오 경보 발령’이 떴다. 하지만 캔터나 주변 사람들은 폴리오 바이러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자신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실체 없는 자신감이 동네를 감쌌다.
지금의 상황도 소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약 191만명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3차 유행으로 매일 수백~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제까지 누적 1000여 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꼼수를 부리며 전염병 확산을 키우고 있는 이들이 많다.

지난 11일 강남의 한 클럽 라운지는 새벽 5시부터 입장객을 받아 오전 10시까지 춤판을 벌였다. 클럽에는 담배연기가 자욱했고 샴페인 병과 잔에는 폭죽을 꽂고 불을 붙였다. 마스크와 거리두기는 실종된 현장이었다. 현재 방역단계에서 클럽은 ‘집합금지’ 상황이지만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후 이와 같은 불법영업을 지속해왔다. 이들은 경찰이 온다는 소식에 조명을 밝히고 일반 음식점처럼 위장해 경찰의 눈을 속였다. 이들이 이렇게 방역수칙을 어기면서까지 춤판을 벌인 이유는 자신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이다. 혹은 젊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었다.
뉴어크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전염병은 땀과 비말을 타고 쉽게 확산됐고 아이들과 뒤섞여 땀범벅이 되어 경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캔터는 폴리오 바이러스로 주변 아이들이 하나둘 사망하게 되는 것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켄터는 심한 좌절감에 빠진다.
여자친구는 이러한 캔터에게 새로운 근무지로 옮길 것을 제안한다. 폴리오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라는 권유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바이러스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평화로운 인디언힐의 청소년 캠프에서 근무하게 된 캔터. 하지만 이곳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둘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캔터가 원인이었다. 자신이 폴리오 보균자인 것도 모르고 캠프에 와서 아이들을 전염시킨 것이다. 그 바이러스로 인해 치명상을 입는다. 팔이 뒤틀렸고 하반신이 마비됐다.
캔터는 자신이 뉴어크의 아이들에게도 병을 전염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큰 죄책감을 가진다. 그는 평생을 이들에게 속죄하며 살기로 한다. 때문에 그에게 사랑은 사치였다. 여자친구를 구애를 거절한 그는 세상과 단절하고 괴롭고, 외롭게 삶을 지탱해간다. 이야기는 훌쩍 27년을 뛰어넘는다. 캔터와 뉴어크에서 체력단련을 함께 하던 한 소년이 화자로 등장하면서부터 이야기는 반전된다.
소년의 이름은 아널드 메스니코프. 그는 당시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폴리오에 감염되어 하체 마비 증상을 겪어야 했지만 재활을 통해 장애를 딛고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다. 메스니코프는 자신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장본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 인생을 고립시킨 캔터를 만나 “혹시 선생님이 범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전혀 책임이 없는 범인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메스니코프의 말은 27년간 죄책감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캔터에게 한줄기 구원을 선사한다. 작가는 메스니코프의 입을 통해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캔터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이다. 캔터와는 달리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메스니코프의 등장은 그동안 캔터가 겪어온 불행과 대비된다. 그의 재활 노력과 살고자 하는 의지,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코로나19로 지친 독자들에게 신선한 희망을 준다.
하지만 소설 <네메시스>의 매력은 역시 캔터에게 있다. 캔터는 죄책감에 스스로 네메시스에게 벌을 받기를 자청했다. 네메시스는 그리스 신화 속 존재로 천벌과 복수의 신이다. 캔터가 자의는 아니지만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죽음과 장애를 입힌 결과에 대해 부끄럽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뻔뻔하게 잘 살았다면 이 소설은 큰 울림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캔터와 같은 사람들이 많기를 바란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누구에게인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는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나 자신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알 수 없는 확신과 젊으니 걸려도 괜찮을 것이라는 이기심을 버리자. 캔터와 같이 누가 바이러스 보균자인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 외에는 그대로 한 곳에 머무르는 것만이 현재 코로나 19로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 인간의 오감이 사라진 날…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 인간들의 어리석은 역사는 샴쌍둥이처럼 반복된다
- 바이러스 이면에 숨겨진 탐욕,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 종말 후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 역병 속에서도 사랑은 계속된다
- 빙하 속 바이러스, 인간에게 덮치다
-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묻다
- 인간이 죽어야 지구가 산다?!
- 아비규환 길 위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은...
- 인간의 신체를 강탈하는 괴바이러스의 정체
- 백신으로 변종 인간이 만들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 40여 년 전 중국 우한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나
- 인간과 미생물과의 전쟁
- 여성들만 걸리는 바이러스
- 보면 죽는 병, 살기 위해서는 안대를 써라
- “네 마음의 소리가 들려”… 노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와 사투 벌인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