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못난 꿈이 한데 모여’ 낸 농부시인 서정홍-1회
경상남도 합천 작은 산골마을에는 시를 짓는 농부가 산다. 그는 농촌 생활을 하면서 겪는 일들에 대해 담담히 시를 써내려간다. 그 시는 이웃과 사회에 작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다. 최근 신간 ‘못난 꿈이 한데 모여’를 낸 시인 서정홍을 만나보았다.

농부시인으로 잘 알려진 그는 지난 2005년 귀농했다. 철저한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물려주고 싶어서다. 심지어 대소변까지 자연에 살리는데 이용하고 있다.
“아이들 앞에 서면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게 살려고, 아이들한테 자연이라는 소중한 고향을 물려주고 싶어서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한 젊은 농부들은 대부분 사람과 자연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독한 농약과 화학비료, 비닐 등을 쓰지 않습니다. 강과 바다를 살리기 위해 수세식 변기에 똥오줌조차 버리지 않고 ‘생태뒷간’을 지어 식구들이 눈 똥오줌을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흙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것을 위해 아이들에게 보존된 자연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모두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앞에 서면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워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도, 교실도, 운동장도, 놀이터도, 교사도, 교육감도,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대통령도, 성직자와 수도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아이들이 살아 있어도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육이니 정치니 종교니 하는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아버지가 할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현실에 쫓겨 하루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이 사오십쯤 되는 평범한 아버지들은 걱정도 많지만 하고 싶은 말도 산처럼 쌓였을 것입니다. 아들딸 낳아 먹여 살리고 키우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져도 ‘아프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만 하면서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참 바쁘게 살았구나!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셋방에서 전세방으로, 전세방에서 작은 집 한 채 마련하느라 자식 녀석이랑 해외는커녕 몇 박 며칠짜리 국내 여행조차 못 갔습니다. 아니, 좋은 영화나 연극 구경은 몇 번이나 함께 봤을까?’ 손가락으로 꼽기가 부끄러운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경제성장’의 압박 속에서 잠깐의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아버지들이었다. 그러한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경제성장’이라는 무서운 괴물한테 홀려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들 녀석이 나이가 들어 큰절하고 훈련소로 가던 날도, 대학을 졸업하던 날도, 따라나서지 못했습니다. 첫사랑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제대로 틈을 내어 말 한마디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아니면 하루라도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온갖 눈치 다 살피느라 그저 고개 숙이고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어느 누구도, 어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늙음 따위에 마음 쓰지 않으며, 자신을 영원한 젊은이로 여겨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 젊은 아버지의 모습을 지니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 사람이 선생 백 사람보다 낫다는 말까지 나왔는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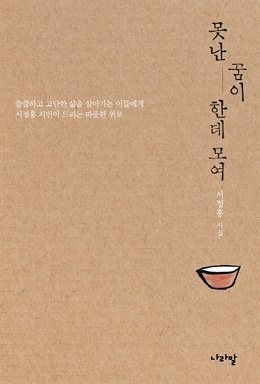
귀농하기 전 그도 이 시대의 아버지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 다른 삶을 선택했을 때 아들의 편지 한 통이 큰 도움이 됐다.
“작은 산골 마을에 들어와 ‘돈도 안 되고 힘든’ 농사를 짓고 사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을 만들어주셔서 스스로 행운아’라고 말하는 아들 녀석의 편지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족사진보면서 기운을 되찾곤 한다는 글을 읽을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때론 가난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해 준 게 없는 못난 아버지인데…….”
벌써 며칠 전부터
바닥이 닳은 고무신에서 물이 올라왔다.
가난한 어머니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셨다.
“정홍아, 고무신이 다 닳았구나.”
“예, 어머니. 고무신 한 켤레 사야겠어요.”
“바닥을 보니 조금 더 신어도 되겠는데…….”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자꾸 들어와서 신을 수가 없어요.”
“옆집에 사는 순재 말 들어보니
고무신에 물이 자꾸 들어오면,
들어오는 반대쪽에 구멍을 하나 내면
물이 잘 빠져나간다더구나.”
“예?”
나는 어머니 말씀대로
고무신에 구멍을 냈다.
그리고 긴 여름이 지나갔다.
그리고 사십 년이 후딱 지나갔다.
- <내가 가장 착해 질 때> 中 '아름다운 시절 4(고무신)'
그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쓴 시를 소개했다. 그의 학창시절은 넉넉하지 못했다. 공부보다는 생계에 힘을 썼다. 1958년 개띠, 그 시절을 같이 보낸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가난한 집안에, 삼남삼녀 가운데 다섯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958년 개띠라 그 시절에는 공부보다는 먹고사는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일하러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학교를 다녔죠.”
그 시절의 감정들은 그가 시를 쓰는 밑거름이 됐다. 가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감정들이 시에 녹아났다.
“추억이 삶을 밀어간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때, 그 가난했던 시절이 지금까지 시를 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가난이 없었다면, 배불리 잘 먹고 잘살았다면, 어찌 시가 가슴에 찾아오겠습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가난한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쓴 시는 가난과 쓸쓸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를 쓰게 된 이유 역시 ‘가난’이었다. 가난의 부당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시로 옮겼다.
“1980년대였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대기업이지 노동자를 ‘가족’이 아니라 ‘노예’처럼 부려먹던 시절이었습니다. 노동법이 있어도 노동자들은 잘 몰라서 당하고, 기업가들은 그걸 이용하여 이리저리 속이며 노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선 안 되지’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기사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