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 여성들의 수다방> 소설 '생사불명 야샤르'를 읽고
우선, 책 읽으면서 떠올랐던 에피소드.
몇 년 전, 처음으로 혼자 전셋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을 때였다. 월말에 받아 본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함께 청구되어 있는 거다(당시 내게는 TV가 없었다). 정정을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을 뿐, 바빠서 잊고 있다가 납기 마감일 며칠 전에야 한전에 전화를 했다.
"TV가 없는데 어떻게 수신료가 청구
된 건가요?"
"50kW 이상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TV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텔레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전력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저는 텔레비전이 없으니 이 요금은 낼 수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다음달부터 고지서를 새로 발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은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번 달 전기요금은 내지 마시고 다음달에 보내드리는 새 고지서로 납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다음 달에 고지서를 새로 받아 내는 거라면, 제가 연체료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만, 고객님 요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50원 정도만 더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애초에 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수신료를 부과한 쪽 잘못이잖습니까."
"그래도 이쪽 체계가∼그리고 TV 수신료는 KBS 관할이기 때문에… 어쩌구 저쩌구."
"그럼 제가 내는 연체료는 어디로 귀속되는 거죠?"
"한전으로 들어갑니다."
"연체료는 한전이 가지면서, 수신료는 KBS 문제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닌데 제가 왜 연체료까지 물면서 일을 처리해야 되죠? 10원이든 100원이든, 전 못 냅니다. 연체료는 빼고 고지서 발부해 주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략 이와 같은 실랑이 끝에 결국 나는, 액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내야 할 금액(그러나 한전 입장에서는 몇백 원이 모자란 금액)만을 한전 계좌로 송금하고 일을 마무리 지었다. 그쪽 담당자도 끝에 가선 약이 잔뜩 올라 내가 내겠다는 금액만 받겠노라 하고 짜증을 내며 끊었는데, 아마 모자란 금액은 그의 개인 돈으로 채워 넣었을 것이다. 몇백 원 가지고 따져 물은 나를 욕하면서….
그런데 이 소설은 위 에피소드보다는 스케일이 훨씬 크다. 주인공 야샤르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자. "정부기관? 공공기관이라고? 그래, 그럼 공공기관이 하는 일이 뭐요? 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더니 `넌 죽었어`라고 하고, 군대에 끌고 갈 때는 `넌 살아 있어`라고 하더니, 또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할 때는 `넌 죽었어`라고 하고, 세금을 거두어 갈 때는 다시 또 `넌 살아 있어`라고 하는, 도대체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들을 해대는 공공기관이라는 곳은 뭘 하는 곳이냐고(484쪽)!"
이 이야기는 지은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단다. 그러나 이런 주제를 `곧이곧대로` 써내려가기엔 사안이 제법 심각하다. 게다가 빽 든든하고, 마음먹은 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한 번쯤 관료주의 시스템에 데어 본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식상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인가? 지은이가 선택한 방식은 풍자다. 그리고 훌륭한 풍자소설들이 그렇듯 이 소설도 적당히 아프고, 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웃기다. 또 그렇기 때문에 대략의 줄거리를 알고 읽어도 충분히 재미있다. 그러나 풍자는 자고로 `내`가 당사자가 아닐 때만 거리낌 없이(과연?) 웃을 수 있는 법. 몇몇 공무원들에게는 이 소설이 생각 이상으로 뜨끔하리라. 그러나 정작 관료님들은 이 재미난 소설을 별로 안 읽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좀 안타깝네 그려.
남 일인 양 비웃어주기는 이쯤 해 두고, 내 걱정이나 해보자. 나의 생사는 안전한지? 영화 `네트`에도 나왔듯, 우리는 이미 해킹을 통해 몇 가지 개인정보가 수정되는 것만으로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전과자가 되기도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언제 누가 갑자기 내게 넌 죽었어,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데 정부는 자신들의 관료주의 시스템은 문제 삼지 않은 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잖아)도 없이 정보 집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두꺼운 `호적대장`은 사라졌지만, 정보 조작과 누출의 위험은 점점 커져만 간다. 이 소설이 결코 `옛날이야기`가 될 수만은 없는 까닭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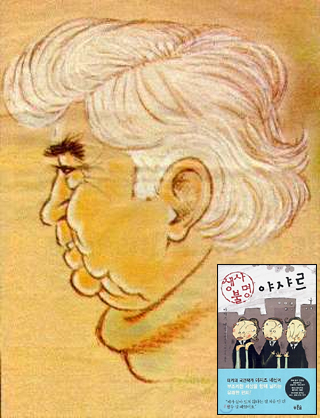
그래도 어쨌건 저런 무시무시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현재로 눈을 한 번 돌려볼까. 한국에도 분명 살아 있으되 살아 있지 않은, `생사불명`인 사람들이 있다. 몸 하나 변변히 누일 곳이 없어 비닐하우스 짓고 사는 이들, 이런 저런 이유로 `노숙`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주민등록 말소자`다. 야샤르와 같은 처지인 거다. 헌데 `노숙자` 사망사고 소식 아래 넘치는 댓글이라고는 고작 "노숙자들은 전부 강제수용소로 보내라" "돈도 못 버는 애들 잘 죽었다" "쓰레기/벌레들 잘 없어졌다" "노숙자들은 전부 안락사 시켜라" 따위다. 맙소사. 그래도 이 소설에서 그려지는 터키 사람들은 야샤르가 죽었대도 왠지 안쉐(야샤르의 여자친구-부인)와 함께 눈물 흘려줄 것 같지 않은가? 지은이가 그리고 있는 터키인들은, 교도소 안이건 밖이건, 최소한 그 정도는 `인간`다우니까 말이다. 그런 면에서 1977년(이 책이 처음 출간된 해다)의 터키는 2007년의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낫다.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따우`(필명) < 이 글은 한국여성민우회(womenlink.or.kr) 홈페이지 칼럼란에 게재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