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의 이런 얘기 저런 삶> 책 이야기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 이라고들 한다. 이 진부해 빠진 문장이, ‘진부’해 질 때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이유를 알 것 같아질 때, 나 역시 어쩔 수 없이 이 문장을 되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진부`해 질 수밖에 없는 문장이다.
데카르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라도 이 말을 진심으로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공유한 그 ‘느낌’을 부정 할 순 없을 거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진리를 추구했다. 잠정적이지만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의심함으로써 확실성을 추구하는 방식. 심지어 눈앞에 있는 풍경과 다른 이의 존재도 의심한다. 종내에는 의심하는 나 자신은 존재만이 확신할 수 있다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귀결.)
주로, 작품성이 높은 작품들을 ‘훌륭하다’고 말한다. 베스트셀러들이 그렇고, 유명한 오페라가 그렇고, 몇 만 명을 돌파했다는 영화들이 그러하다. 그리고 그 훌륭함의 정도는 별 다섯 개로 평가되어진다. 별 다섯 개짜리 작품이 나에게 벅찬 감동을 안겨줄 확률은 별 하나짜리 작품보다 확실히 더 높다.
그러나 언제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좋은 작품을 골라 감상하고 싶다면 별점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조언이 인터넷에 떠돌 정도다. 다들 한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높은 별점과 감동적이라는 후기들을 믿고 선택한 영화가 상영시간 내내 ‘대체 이건 뭐지’ 싶었다든가, 악평들 때문에 기대도 안 했던 조그만 연극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든가.
어느 정도 일반성은 존재하지만, 무언가를 감상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상’은 개개인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작품은 훌륭했다’가 ‘내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작품이었다’와 같은 말은 아니다. 지극히 뛰어난 작품성을 지녔지만,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의 감동이 없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런 감동은 무작위로, 마치 작품과는 별개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책은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다. 이성적이지 않은 내 속의 어떤 감각기관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무언가에 탁 하고 걸려 반응한다. 객관적으로 소름이 돋을 만큼 훌륭한 책들은 이 감각기관을 건드리지도 못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책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을 작가의 얄미울 만큼 잘난 글 솜씨에 외려 짜증이 날 정도인데도 이 녀석들의 촉수는 마치 배부른 말미잘마냥 태연하게 그 팔을 흔들 뿐이다. 그런 주제에 정말 대수롭지 않은 녀석에게 정신을 놓고 달려든다. 그럴 때면 무심코 움직이다가 팔꿈치를 찧은 것처럼 찌르르해진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대체 기준이 뭔지. 그런 책을 읽고 있노라면 손이 차가워 질 때까지 심장이 뛴다. 내 갈비뼈 안으로는 오로지 심장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잠들기 전에 스탠드 밑에서 읽는 책에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 그날 잠을 자는 건 글렀다고 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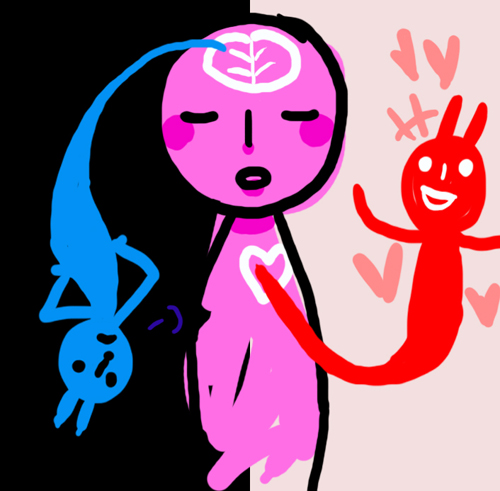
#박신영 그림
내가 감탄했던 책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가슴 벅차게 사랑했던 책들은 기억해 보건대 대략 세권.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다 일거다. 지금은 정말로 제목조차 기억이 안 나서, 이산가족마냥 막연하게 그리워만 하는 중학교 때의 어떤 영문법책. 심지어 표지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 때 내가 왜 그 책을 내 손에 넣지 않았는지!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었건만 ‘감동’해버렸던 ‘나는 남자보다 적금통장이 좋다’.
물론 이 책은 다시 읽고 싶은 맘이 들지 않는다. 잠들지 못 할 만큼 날 설레게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책. 이런 조악하기 그지없는 문체와 금이 간 채로 일주일 동안 실온 보관된 계란 같은 신선도의 소설 따위가, 생각하면서도 심장이 뛴다. 오늘 일찍 자긴 글렀다. 적어 놓고 보니 셋 다 참 별 쓰잘 데 없는 책이다. 이왕이면 개인적으로 높이 사는 ‘설득의 심리학’ 같은 잘 빠진 책을 사랑했으면 좋을 텐데, 스스로도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사심 없이 제가 아는 걸 내어주는 것에 감동하는 건가, 잠시 생각했다가 이내 머릿속에서 그 기준을 북북 지운다. 그걸로는 내가 로버트 치알디니(‘설득의 심리학’ 저자)를 끔찍하게 좋아하면서도 사랑하지는 못하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건 마치, 잘생기고 학벌도 매너도 좋은 훌륭한 조건의 맞선남보다 딱히 내세울 것 없고 심지어 내 이상형과도 아주 아주 거리가 먼 어떤 이에게 더 끌리는 기분과 같다. 머리로는 충분히 어느 쪽이 더 훌륭하다는 걸 알겠는데도 마음이 그를 따라 동하지는 않는다.
대체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하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하는 일인 걸지도 모르겠다.
머리를 아무리 굴린대도 어떤 ‘조건’을 갖춰야 사랑 혹은 감동이 ‘발동’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감동하는 때야 말로 이성과 감성이 가장 또렷하게 구분되는 때다. 노른자와 흰자마냥. 뭐, 이건 미지의 어떤 ‘퍼니본’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겠다.(퍼니본: 팔꿈치의 척골의 위쪽. 신경이 아주 예민하여 부딪치면 찌릿하게 아픈 부위) 딱히 다른 방법도 없고.
별점을 준다면 세 개 이상은 주기 힘든 이 책을, 구매하기로 한다. 그래도 책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간단해서 좋다^-^. 
psy5432@nate.com <박신영님은 경희대 법학과 학생입니다. `위클리서울` 대학생 기자로 멋진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후에 쓴 글인데 게재가 다소 늦어진 점 독자님들의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