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의 이런 얘기 저런 삶> 글쓰기

내가 글을 잘 못 쓴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다.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다. 내가 공부를 잘 못 한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다. 내가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였다.
저번 학기엔 글쓰기 수업을 수강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과제로 대체되는, 그야말로 ‘글쓰기 실력’으로 성적이 매겨지는 수업이었다. 자신 있었다. 나는 글을 잘 쓴다. 겸손한 척 했지만, 나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성적표의 ‘A+’를 학기 중에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A+란 말인가. 오만했다. 그리고 멍청했다. 나는 그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했다. 내 보잘 것 없는 자신은, 어이없게도 B+로 마무리 되었다. B+? 눈을 의심했다. 정말로 B+이었다. A도, 심지어 A-도 아니고. 띵했다. 스스로도 아주 만족해하며 제출한 과제였는데, 그게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건가?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서 물어보고 싶었다. 제가 그렇게 못 썼나요? 저보다 잘 쓴 학생의 글을 읽어봐도 될까요? 그렇지만 억울함보다 부끄러움이 조금, 앞섰다. 금방 꼬리를 내린다. 안목 있는 사람이 보기에, 내 글은 그 정도인가 보지. 그럴 수도 있다. 글을 잘 쓴다고,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 딱히 그 자신감의 근거를 대라면 말문이 턱 막힌다. 그렇다면, 내가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면, B+도 이해가 간다. 음. 나는 글을 잘 쓰는 건 아니구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을 수도 있겠다. 흉중에서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 피슈슈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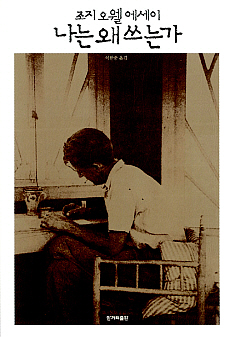
생각한다. 글뿐인가. 나는 그림을 잘 그린다. 정말로? 글쎄. 나는 공부를 잘 한다. 정말로? 글쎄. 슬슬 무서워진다. “정말로?” 이 짧은 반문의 무게가 이렇게도 무거웠던가. ‘정말로?’ 앞에서 살아남는 것이 없다. 난 그럼 뭘 잘 하지? 자신 있게 ‘응’하고 대답할 수 있는 건 없나? 생각나는 게 없다. 우와, 놀라울 지경. 특별히 잘하는 게 이렇게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단숨에 키가 5센티도 넘게 작아진 기분을 느낀다. 앉은 의자의 높이가 간신히 내 키를 지탱해준다. 의자 다리가 단단하지 않았으면 흐물흐물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신감이 사라질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자신감, 마치 척추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졸지에 무척추동물이 되어버린 나는, 스물셋 나이가 어렵게도 사춘기 소녀처럼 끙끙 앓는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수줍은 자아고민이다. 난 잘하는 게 뭘까.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낯설다. 이 나이에 이런 상황은 말도 안 된다.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이런 류의 고민은 해본 적이 없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등뼈가 있어야 할 자리가 흐물흐물해서, 기분도 흐물흐물,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다. 이런, 이게 도대체 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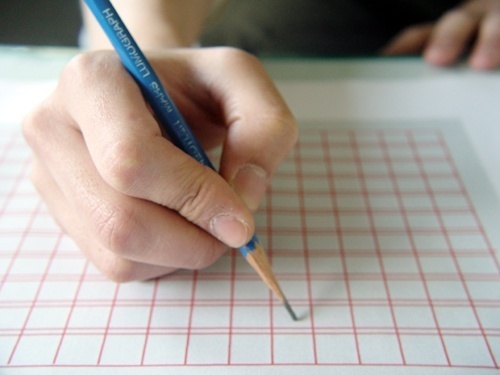
갑자기 어린 날, 허벅다리와 골반을 잇는 관절이 굉장히 아팠던 밤이 떠오른다. 중학교 때였던 것 같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깼는데, 상체를 일으키려 힘을 주었더니, 욱신 하고 관절이 아팠다. 쥐가 난 것처럼. 나도 모르게 흡, 하고 숨을 삼켰다. 그러더니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식은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로 아파졌다. 그 고통에 잔뜩 쫄아서 식물처럼 누워있었다. 화장실은 가야겠는데, 움직일 수는 없고. 캄캄한 천장을 보고 누워서 한참을 고민했다. 작은 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내 방과 엄마가 있는 방이 너무 멀어서,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달리 방도가 없었다. 엄마. 엄마아. 근데 엄마가 정말로 깨셔서 내방으로 오셨다. 엄마가 날 안아서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었다. 아주 어렸을 때 말고는 이렇게 엄마가 화장실 밖에서 날 기다리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조금 수줍었다. 변기 위에 앉아서 엄마, 나 왜 다리가 아플까요? 하고 물었다. 문 밖에서 엄마가 키 크려고 그래, 하고 말했다. 캄캄한 천정 아래에서 불치병이니 뭐니 오만 생각을 다 했던 게 무색하게도 엄마의 그 한마디는 어린 나를 단숨에 안심시켰다. 엄마도 어릴 때 아팠어요? 응 나도 아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진단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천천히 움직여도 아까만큼 고통스러운 느낌은 아니었다. 통증이 덜해진 것도 아닌데 이상한 일이었다. 끝났어요, 하고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주홍빛 불이 문틈으로 새어나가 엄마 얼굴을 비췄다. 그 모습을 보니 남은 불안도 모두 눈 녹듯 사라지는 게 느껴졌다. 엄마는 나를 다시 안아 침대에 눕혔다. 중학생이라곤 하지만 엄마만큼 커다란 나를 안는 것이 힘에 부칠 텐데도, 내 기억 속에 엄마는 힘들다거나 그래 보이지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그때보다 더 어린 나를 대하듯 토닥토닥 머리맡에 앉아 계셨다. 다음날이 되니 다리는 더 아프지 않았고, 얼마 안 있어 정말로 키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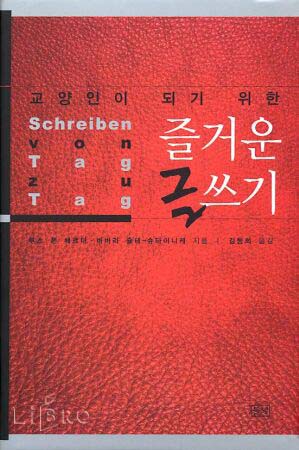
사실 스물 셋 나이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사춘기를 모르고 자란 나는 오히려 이런 기분이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다들 한번쯤은 겪었을 테고 그다지 별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니 한결 편안해졌다. 뭔가 더 나아진다거나,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어야 한다. 나는 글을 잘 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잘 쓰는 게 아닐 지도 모른다는 건, 그리고 그게 꽤나 고민스럽다는 건, 일종의 성장통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일일지 모른다. 기분이 유쾌하진 않지만 말이다. 지금보다 좀 더 잘 쓰게 될 거다. 작으면서도 작은 줄을 모르던 때보다야 잘 쓰게 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 나이에 성장통은 역시 남들에게 말하긴 조금 부끄러워서 주홍불빛 어리던 어머니 얼굴 같은 조언은 구하기 힘들다만, 성장통이라고 생각하니 아까 같이 막연하게 흩어지는 기분은 좀 덜하게 되었다. 자라기 시작하면 더는 아프지 않을 거다. 성장통이니까. 글도, 그림도, 공부도 좀 더 잘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후에는 ‘정말로’ 잘 하게 될 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녀도 아닌 주제에 어렵게도 성장통이나 앓고 있는 나에게 어떤 비웃음도 없이 알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 주는 스승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이다. 곧장 도서관으로 간다. 글쓰기의 이해. 작가 수업. 저명한 일러스트집.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뭔가 굉장히 우습지만, 책을 대출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무척추동물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ㅋㅋ 수줍으니까 몰래 읽어야겠다.

psy5432@nate.com <박신영님은 경희대 법학과 학생입니다. `위클리서울` 대학생 기자로 멋진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