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우·김석기 지음/ 들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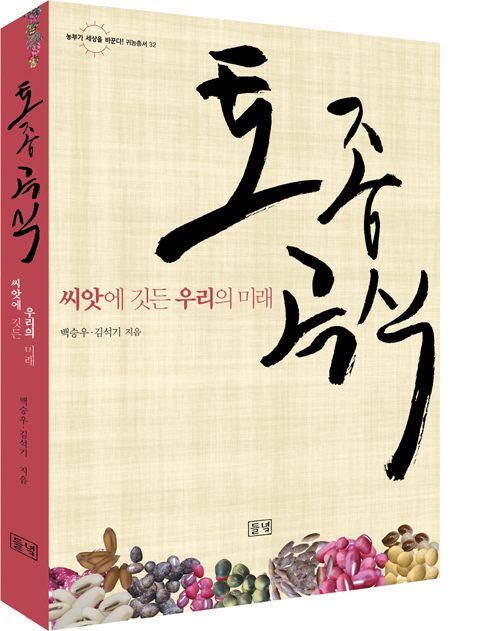
같은 작물이라도 농부마다 농사짓는 방법이 다 다르다. 경험을 통해 얻은 자기만의 비법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랜 시간 우리 땅의 특성에 적응한 토종 곡식에는 이들에만 맞는 토종 농사법이 있다. 작물이 잘 자라는 땅, 품이 덜 드는 효과적인 농사법 등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이다.
『토종 곡식』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사라질지도 모르는, 현역 농부들의 노하우와 토종 씨앗의 역사를 담은 책이다. 농부인 저자들은 이 땅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토종 곡식을 기르고 먹는 농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나이 든 농사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중에는 도시에 좋은 먹을거리를 공급한다는 마음으로 토종 곡식을 기르는, 젊은 농부들도 있다. 착하고 끈기 있는 농부들은 토종 곡식을 어떻게 잘 기르고, 잘 먹는지 등 긴 세월 쌓은 지식을 아낌없이 퍼준다. 실용적인 지식을 담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토종 곡식과 어우러진 농부의 삶 이야기가 가득하다.
‘참살이’ 바람이 불면서 이제는 하얀 쌀밥보다는 알록달록한 잡곡밥이 몸에 더 좋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는 남의 땅에서 기른 잡곡을 먹는다. “싸다”, “원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산이 없”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만 해도 밀의 자급률은 27%였지만 2012년 현재 1%대로 떨어졌다. 30년 동안 팥 국내 생산량은 약 1/10로 줄었고 빈자리는 당연히 수입 팥이 차지했다.
『토종 곡식』은 ‘가뭄에 콩 나’는 정도로 뜸한, 잡곡의 국내 생산을 책임지는 농부들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토종’ 씨앗을 심는다. 우리나라에서 자랐다고 무조건 ‘토종’ 이름표가 붙는 것은 아니다. 토종 자격을 얻는 데에는 긴 세월과 땀이 필요하다. 농부들은 매해 농사를 짓고 나서 다음 해에 좀 더 좋은 수확물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선별 작업을 한다. 종자로 쓰려고 힘들게 얻은 씨앗은 후대의 손에서 같은 과정을 거친다. “우리 땅과 하늘과 비와 바람이 농사꾼의 손을 빌어 선택한 씨앗”만이 토종이 된다. 토종 곡식은 농부와 땅, 씨앗의 협업으로 얻은 수확이다.
『토종 곡식』에는 화학 비료나 제초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전통지식’이 가득하다. 책 속 할머니들은 이웃과 씨앗을 나누고 노하우도 전수하던 인심 좋은 농부였다. 이제는 그들이 전하는 무궁무진한 지혜를 젊은 농부들이 물려받을 차례이다.
정리 이주리 기자 juyu2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