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김양미의 ‘해장국 한 그릇’
[위클리서울=김양미 기자] 지난 달, 책을 내고 많은 일이 있었다.
태어나 생전 처음, 사인이라는 것을 해보았고 내 책을 읽은 독자가 올려주신 리뷰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니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별점과 리뷰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물론, 맞는 말이다. 좋은 말도 나쁜 평가도 세상에 책을 내어놓는 순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맞다. 하지만 몸에 좋은 쓴 말과 몸에 나쁜 쓴 말은 같지 않아서 때론 상처가 되기도 한다.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올려주신 리뷰를 읽었다. 그 중에 한 사람, 얼마 전 에세이집(‘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 이유출판사)을 출간한 홍소영 작가가 쓴, ‘내 인생의 혹’이라는 리뷰가 유독 마음을 울렸다. 만삭의 몸인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에게 가버린 남편의 빈 자리를 채우며 씩씩하게 살아온 싱글 맘이기도 하다. 그녀의 인생과 버무려진 리뷰를 옮겨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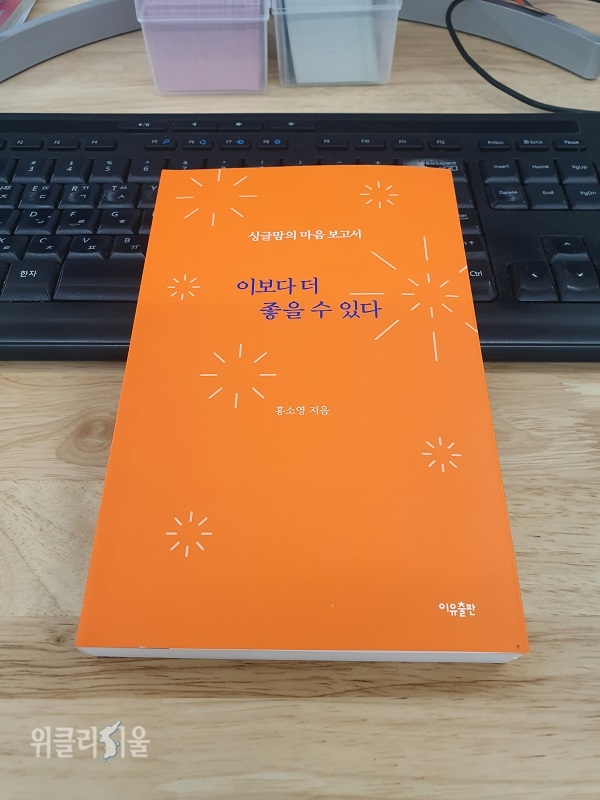
《죽은 고양이를 태우다, 김양미》 이 소설집을 읽은 지는 꽤 되었다. 직후의 감정을 그대로 종이에 옮길 수도 있었지만, 감정을 감정인 채로 얼마간 두고 싶었다.
내 딸 재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른다. 내겐 메모력이 없어 다 휘발되었다, 고 생각했다. 아닌가 보다. 불쑥, 기억이 튀어나와 놀랄 때가 있다. 이 책을 읽다가도 그랬다. 두 살 재희 이마에 난 상처, 나 때문에 난 그 혹이 서프라이즈 상자 속 광대처럼 튀어나왔다. 그날 밤 나는 미끄럼틀 분해를 끝마치고 샤워하는 물줄기에 울음을 흘려보냈지.
*
P와 살던 집을 떠나 두 살 재희를 데리고 이사 온, 지은 지 얼마 안 된 이 빌라의 202호가 나는 좋았다. 열 평도 채 못 되었고 그래서 아늑했다. 거실 없는 투룸이라 방 하나를 거실로 썼다.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던 재희는 종일 나랑 붙어 지냈다. 심심해 보였다. 미끄럼틀을 사자! 나는 뭐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간다. 중고나라를 이 잡듯 뒤져서 3만 원에 파는 아기 미끄럼틀을 발견했다. 빨강 파랑 코끼리 모양이었다. 자동차가 없다고 말하자 선한 인상의 젊은 부부가 직접 분해한 미끄럼틀을 들고 와 줬다. 거실에 그것을 놓고 가면서 그들은 표정으로 대화했다. 마주보고 미간을 찡그리며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의아했지만 고맙다 인사하고 그들을 배웅했다.
“재희야, 엄마가 이거 금방 조립해줄게. 이제 미끄럼틀 타고 노는 거야!”
오랜만에 설렜다. 모성이 부족하다 자책해온 내가 엄마‘다운’ 본인 모습에 도취되어 조립을 시작한다. 다 끝났다. 조립할 때보다 완성된 미끄럼틀을 보며 멍 때린 시간이 더 길었다. 거실로 쓰는 이 방이 거실로 쓰는 방이므로 크다고 상정한 내 멋대로의 눈을 질책했다. 미끄럼틀은 크지 않았다. 거실(로 쓰는 이 방)이 너무 작았다. 대각선으로 겨우 놓고 보니 미끄럼틀 맨 아래와 베란다 유리문 사이 공간이 20cm밖에 안 되었다. 플라스틱 코끼리가 거실을 땅 따먹었다. 그 부부의 갸웃갸웃 고개가 스쳐 지나간다.
그래도 나는 웃었다. 재희가 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까르르 웃을 걸 생각하니 웃음이 났다. 재희야, 재희야, 얼른 와서 타 봐. 아직 말도 잘 못 하는 재희가 신이 난 몸짓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좀 더 자라면 천장에 머리가 닿겠군, 나는 생각했다. 재희가 가장 높은 곳에 앉았다. 나는 재희 엉덩이를 밀었다. 꺄하하, 웃음 꽃망울을 터뜨리며 아기 재희가 내려간다.
“쿵! 으아아앙~~~~”
자지러지는 울음소리......
별 조명이 쏘아 올려져 초록 어둠이 된 방 이부자리에 우리가 누웠다. 잠든 재희가 쌕쌕 소리를 낸다. 나는 아이 쪽으로 모로 누워 백만 불짜리라고 칭찬이 자자한 재희의 짱구 이마를 어루만졌다. 톡 불거져 나온 혹, 내가 만든 혹이 만져진다.
나는 거실로 나가 미끄럼틀을 분해했다. 투명 테이프로 돌돌 감싼 그 코끼리 뼈들을 바라보다가 중고나라에 올렸다.
‘오늘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미끄럼틀이에요. 사이즈 체크를 잘못해서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싸게 팔아요. 만 원입니다.’
10분 만에 문자가 왔다.
*

《죽은 고양이를 태우다》 속엔 혹을 내고 혹이 되는 인물이 있다. 이춘배가 그렇고 죽은 고양이가 그렇다. 아니, 안 그런 인물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있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누군가의 혹이기 때문이다. 하여 서로의 혹이 된 둘이 마주 앉아 날달걀로 서로의 혹을 문질문질 해준다. 어차피 누군가의 혹이 될 거라면, 누군가의 혹을 받아줘야 할 거라면 그래, 우리끼리가 좋겠어, 하면서. 그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뭐, 인간은 이름 붙이기 강박증 환자니까, 그게 사랑이고 우정일 것이다. 모성이고 전우애다. 사랑받고 싶어서 내 이마를 내가 때리기도 하는 아기 같은 인간들. 여기 좀 봐봐, 혹 났어, 호 해주는 사람이 너였으면 해.
귀엽다. 나는 능숙한 사람에게서도 그 사람의 서툰 면에 빠진다. 그가 귀여워 보이면 끝인 거다. 뭘 해도 귀여우니 다 봐줄 수 있다. 단, 나한테 잘해줘야 한다. 어저께 글인지 드라마인지에서 본 어떤 할머니가 손녀한테 건네는 대사에서도 그랬다.
“돈 그까이꺼 다 필요 없어.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여!”
‘내 애인 이춘배’ 씨의 잘해줌이란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주는 것이다. 내 비록 아기 재희의 이마에 혹을 낸 비정상적인 엄마지만 재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만큼은 끝장나게 구워줄 수 있다. 표정만으로도 내 딸을 미친 듯이 웃게 만드는 엄마, 그게 나다. 정상이라는 말이 가장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왔다. 오랜만에 영화 <예의 없는 것들>에 나오는 발레 킬라(김민준)의 대사,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대사를 읊어보련다.
“정상인이라는 게 수적인 우세로 본 통계적 개념 아닌가?”
정상, 그뿐이다.
혹들이여, 외쳐봅시다. “사랑하면 다 정상!”
....................
나는 이 글을 쓴 홍소영 작가를 누구보다 열렬히 응원한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부대끼고 사는 수많은 혹들을 향해, 너희들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도, 누군가에게 혹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죽은 고양이를 태우다> 저자


